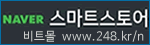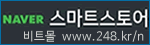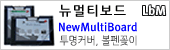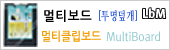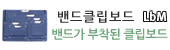무과에 급제하고
세조 때 포도부장에서 선전관을
거쳐
1482년(성종 13) 전주판관,
1485년 훈련원 판관,
1486년 경원도호부가,
1488년 첨지중추부사,
1489년 전라우도 수군절도사,
1491년에는 다시
첨지중추부사 등을 역임한 후
1492년 온성부사,
1494년 회령부사를
지냈으며,
1499년(연산군 5) 조전절제사로 충절하였다.
1500년 회랑도(현재
중국 영토) 초무사가 되어 이 섬을 평정하였고,
1504년 좌상대장에 이로
한성부 좌윤이 되었으며,
1505년 사은사로 명나라에 다녀와서
1506년
그 용맹을 인정받아 한성부 판윤이 되었고, 연산군이 사망했을 때는
6조와 더불어 장례위원이 되었다.
청백한 무장으로 독서를 즐겼으며,
준법정신이 투철하여 불의에 굴하지 않아, 당시 횡포가 심했던 우의정
홍윤성(洪允成)도 그의 기개에 감탄하였다 한다.
또 한성부 판윤으로
있을 때는 회산군(성종의 5남)이 법을 어겨 건축하는 것을 발견하고
그 책임자를 불러 문책하자 즉시 법에 맞도록 뜯고 줄이고 하여 용서를
빌었다 한다.
당시 세상에서는 맹문장이란 별칭으로 불리었는데,
아들이 행패를 부리자 살해하고도 태연하였다 한다.
일벌백계정신을
알 수 있다.
그가 병으로 위독할 때 문병 온 친구
김전(金詮)과 큰 바리로 이별주를
나누고 김전(金詮)이 대문을 나서기 전에 숨졌다 한다.
「조선 초기에 법이 가장 옥처럼 빛난 때는 전림에게 법이 대행됐을 때」라는 말이 후세에
전한다.
|